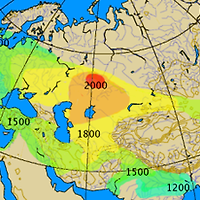노대통령이 처음 낸 자서전적인 책 <여보, 나좀 도와줘>에는 자식농사의 어려움을 토로한 내용이 있다.
그때도 지금과 마찬가지로 아이들이 입시 공부에 짓눌려 인간성 발달에 문제가 심각하다고 모두들 걱정이 많을 때였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어떤 부모들도 아이들의 성적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그렇지만 나는 이 풍조에 과감히 도전장을 냈다. 내 아이들을 성적의 노예가 되도록 내버려두진 않겠다고 결심했다. 그래서 아이들을 놀렸다. 놀지 않으면 내가 데리고 놀았다. 아내가 걱정을 하면, "괜찮아. 내가 책임진다."는 한 마디로 밀어붙였다.
그런데 큰놈이 고등학교 2학년쯤 되자 문제가 생겼다. 그 동안 부자간에 죽이 맞아서 놀기는 잘 놀았는데, 막상 고2가 되니 사정이 달라진 것이다. 학교에 가면 선생님도 친구들도 온통 대학 이야기뿐이니, 큰놈으로서는 대학 입시 걱정을 안할 수가 없게 된 것이다. 그렇다고 공부를 하려 하니, 이미 공부좀 하는 아이들은 중3과 고1 때 미리 고등학교 과정을 공부해 뒀고, 게다가 학교 수업은 그 아이들에게 맞추어 진도가 나가니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다는 것이다.
큰놈은 뒤늦게라도 따라가 보겠다고 한 동안 공부에 매달리는 것 같더니, 나중에는 슬금슬금 친구들과 어울려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우며 왕창 놀아 버리는 것 같았다. 노는 것도 문제지만, 스스로의 불안감으로 인해 행동이 거칠어지고 불안정해지는 것이 점점 자포자기 상태로 빠지는 것이 아닌가 하여 더 걱정스러웠다.
나는 아이들 문제로는 처음으로 비상이 걸렸다. 가고 싶은 학과에 실력 때문에 갈 수 없을 것 같아 고민하는 큰놈을 붙잡고 달랬다.
"건호야, 대학교에서 전공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미국 같은 나라에서도 대학 졸업 후 전공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은 다섯 중에 하나도 안된단다. 하물며 우리 나라처럼 성적에 맞추어 대학과 학과를 선택하는 우에는 더 말해 무엇하겠냐. 어느 학과를 나와도 나중에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다."
또 이렇게 달래기도 했다.
"대학에 가는 목적은 다 같은 것이 아니다. 어떤 사람은 전문 연구가가 되기 위해서 대학을 가고, 어떤 사람은 취직 자리를 얻으려고 대학에 가기도 하지만, 훌륭한 시민의 소양을 쌓기 위해서 대학에 갈 수도 있는 것이다. 시민으로서의 소양을 쌓기 위해 대학에 간다 생각하면 학과가 중요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리고 대학을 졸업하고 다시 다른 공부를 하고 싶으면 네 나이 40살까지는 내가 책임지마. 그래야 할 형편이면 내가 정치를 그만 두고라도 돈을 벌어 너를 밀어 줄테다."
그밖에도 별 소리를 다 해 가며 아이를 안심시키려고 애를 썼다. 40살까지 아비가 책임지겠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지만, 당시에는 그걸 따질 겨를이 없었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의 자식들이 어떻게 되었던가. 법원의 판단이 난 것은 아니었지만 일종의 사후뇌물이라는 이현령비현령식의 고무줄 잣대였지만 아들과 조카를 통해서 받았던 박연차의 돈이 문제가 되었다. 이가 결국은 노대통령의 불행한 마지막의 직접적은 아니지만 간접적 계기는 적어도 제공했던 것 같다. 돈이 입금되었던 시점은 노대통령의 퇴임후인 상태에서 이것을 부패하고 권력추종형 대한민국의 검찰의 판단대로 뇌물일가고 단정지을 수는 없지만, 아무래도 명예를 위해 목숨도 버릴 노대통령이 자식때문에 무리했던 것이라고는 생각하고 있다.
난 이점에 대해서도 노대통령을 이해하는 편이다. 사실 마음에 더 안들었던 것이 재벌이나 기득권자들을 상대하겠다는 노대통령의 아들이 결국 모 대기업에 취직했을 때 솔까(?)말 대한민국이 좁디 좁은 나라다라는 말이 생각났다. 폐쇄적 군대와 몇몇 회사에서는 공공연히 입사시 부모님은 물론 각종 친척들의 직업이나 계급까지 빠짐없이 적어달라고 요구하는 사회에서 설령 검찰의 의심이 사실이라도 정말 그것이 그렇게 커다란 잘못이라는데는 공감되지 않는다. 적어도 "떡찰"이란 비아냥을 받으면서도 익명성 뒤에 숨어서 비겁하게 뒷통수 치는 그들이 나설 일은 아니었다.
'역사와 사회'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멘도사수사본(Codex Mendoza) (0) | 2014.04.14 |
|---|---|
| 중국 문헌 <춘추좌전>에 나타나는 전차신 (0) | 2013.12.31 |
| 다윗과 솔로몬 시대 예루살렘 유물 발견? (0) | 2013.11.17 |
| 로마를 처음 약탈한 브렌누스의 일화 (0) | 2013.11.13 |
| 말세와 종말에 관해 (0) | 2013.11.07 |